귀퉁이 서재
[알베르 까뮈] 이방인을 다시 읽으며...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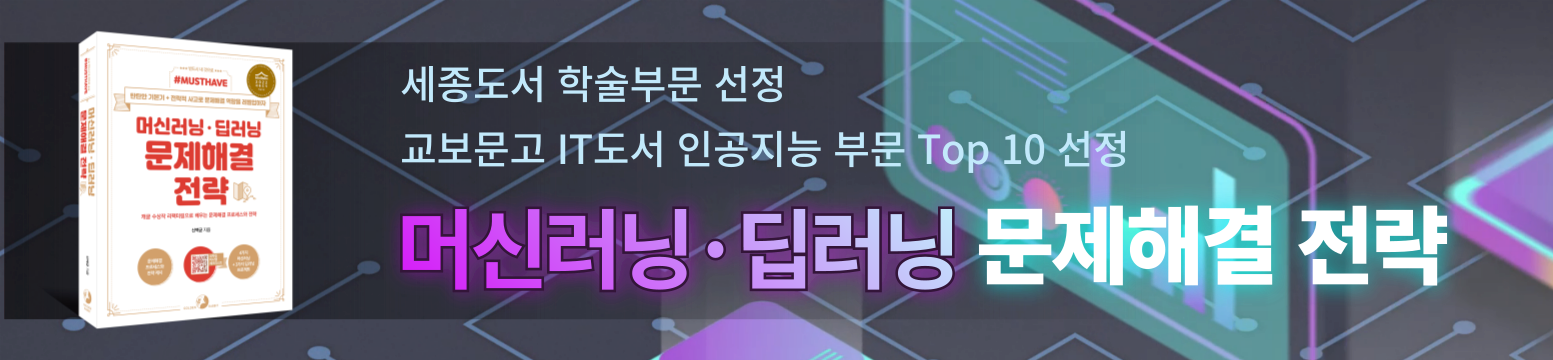
여러 해 동안 <이방인>을 5번 이상 읽은 것 같다. 지금까지 문예출판사(이휘영 역)와 소담출판사(유혜경 역) 버전을 읽었는데, 이번에는 열린책들(김예령 역) 버전을 읽어봤다. 민음사(김화영 역) 판본을 읽었는진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3~4개 출판사 가운데 어떤 출판사 버전이 더 나은진 비교가 어렵다. 서로 비교하며 읽은 건 아니고, 8년 동안 5~6번 읽어 시간 텀이 길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크게 불만족스러운 번역은 없었다. 취향에 따라 다르지만, 여러 출판사 가운데 나는 민음사 세계문학전집을 좋아한다. 민음사가 대체로 저자의 글을 있는 그대로 직역해서다. 의역이 더 쉽게 읽히긴 한다. 그렇지만 의역을 하면 옮긴이의 의도나 생각이 더해지는 경우가 있다. 잘 안 읽히더라도 저자의 글을 있는 그대로 읽고 싶어서 직역을 좋아한다.
<이방인>을 처음 읽은 때는 8년 전이다. 8년 전에 꽤 여운있게 읽어서 그런지 그 후로 인터넷에서 닉네임을 정해야 할 일이 있으면 고민하지 않고 '까뮈'라고 짓곤 한다. 맨 처음 이방인을 읽었을 때, 나는 실존주의를 전혀 몰랐다. 실존주의나 까뮈 사상을 모른 상태로 읽어서 그런지, 책 마지막에 뫼르소가 사제에게 울부짖으며 내뱉은 말이 적잖이 충격적이었다.
이제는 실존주의를 어느 정도 알고, 까뮈의 사상도 아주 조금 안다. 그래서 다시 이방인이 읽고 싶었다. 이미 실존철학을 대충이나마 아는 상태라 맨 처음 <이방인>을 읽을 때에 비해 여운은 덜하지만, 마지막 뫼르소의 독백과 울부짖음은 여전히 훌륭하다. <이방인>의 전체 내용이 마지막 독백을 위한 빌드업 단계 같달까.
롤랑 바르트는 <이방인>의 출간을 "건전지의 발명과 맞먹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까뮈는 <이방인>을 29살 때 썼다. 20대 때 무슨 생각으로 살았길래 29살 때 이런 책을 썼을까.

<이방인>은 이렇게 시작한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였을까.
엄마가 죽은 날 주인공 뫼르소는 울지 않았다. 관에 있는 엄마를 마지막으로 볼 거냐는 지배인의 물음에 보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다음날 뫼르소는 해수욕장에 갔다. 날씨가 맑아 좋았다. 엄마가 죽지 않았으면 기분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전 직장 동료인 마리와 물놀이를 하며 키스를 하고 정사까지 한다. 며칠 후 뫼르소는 일상에 복귀한다. 그러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곳에서 아랍인들을 마주친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른다. 내리쬐는 태양과 눈을 적신 땀 때문에 뫼르소는 아랍인을 총으로 쏴 죽였다. 결국 살인 혐의로 재판이 열린다. 엄마의 장례식 때 울지 않았고, 다음날 여자친구와 해수욕을 했기에 뫼르소 죄질은 더 나쁘게 판결됐다. 뫼르소는 실제 자신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자신이 묘사되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변호사가 잠자코 가만히 있으라고 했기 때문이다. 끝내 사형 선고를 받는다.
감옥에 갇힌 뫼르소에게 사제가 찾아온다. 대개 사형수는 마지막에 신에 귀의하며 마음의 짐을 덜어낸다. 하지만 뫼르소에게는 사제가 필요 없었다. 신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사제가 뫼르소를 여러 차례 설득했지만 소용없다. 뫼르소는 삶의 목적 따위는 없다고 말한다. 사제는 뫼르소에게 이렇게 묻는다.
"그러니까 당신은 아무런 희망도 품지 않고 그처럼 전적으로 송두리째 죽고 말리라는 생각을 품은 채 살겠다는 말입니까?"
"예"라고 뫼르소는 대답했다.
계속되는 사제의 설득에 뫼르소는 이렇게 울부짖으며 소리친다.
"나는 이전에도 옳았고 여전히 옳고 언제나 옳아. 난 이런 식으로 살았어. 아마 다른 식으로 살 수도 있었을 테지. 나는 이런 걸 했고 저런 걸 하지 않았어. 이런 일을 하지 않는 대신 다른 일을 했지.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고? 바로 이렇게! 마치 내내 이 순간만 어쩌면 내 무죄가 입증될 수도 있을 저 이른 새벽만 줄기차게 기다렸던 것처럼 되었어.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그 이유가 뭔지 난 잘 알고 있어. 당신도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을 거야."
간수들이 결국 사제를 뫼르소에게서 떼어놓는다. 뫼르소는 혼자 남았다. 곧 닥칠 처형을 기다리면서. 죽음에 다다르자 뫼르소는 비로소 해방된 느낌을 받는다. <이방인>의 마지막 단락이 뫼르소의 해방감을 잘 보여준다.
'나는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엄마 생각을 했다. 엄마가 어째서 인생의 끝에 다다라 약혼자를 갖게 되었는지, 그리하여 어째서 다시 모든 걸 시작하는 듯한 장난을 받아들였는지 알 것 같은 느낌이었다. 거기서도 그러니까 이제 차츰차츰 생들이 꺼져가는 그 양로원 주변에서도 역시 저녁은 애수 어린 휴식의 순간 같았지. 그처럼 죽음에 가까이 이르러서 엄마는 자신이 자유롭게 해방되었으며 따라서 다시 모든 것을 살 준비가 되어있다고 느꼈음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아무에게도, 진정 아무에게도 엄마에 관해 울 권리가 없다. 그리고 나는 나 또한 엄마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다시 살 준비가 되어있음을 느꼈다. 좀 전에 거대한 분노가 내 속의 악덕을 씻어내고 희망을 비워낸 것이기라도 하듯 나는 기호들과 별들로 가득한 밤 앞에 서서 처음으로 세상의 애정 어린 무심함을 향해 나 자신을 열었다. 세상이 그처럼 나와 닮았다는 것을, 요컨대 그토록 형제 같다는 걸 실감하면서. 나는 내가 행복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마무리되길. 나 자신이 혼자라는 걸 보다 덜 느낄 수 있길. 그렇게 되기 위해 나의 처형일에 수많은 구경꾼들이 모여 증오의 함성으로 나를 맞기를 희망하는 것만이 이제 내게 남은 일이었다.'
까뮈를 만날 수만 있다면 꼭 묻고 싶은 말이 있다.
까뮈 선생님, 어떻게 29살에 이런 소설을 쓰셨습니까.
당신은 어떤 생각으로 삶을 사셨나요?
평소 어떤 책을 읽고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책과 사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세네카] 인생론 (0) | 2023.01.23 |
|---|---|
| [수 프리도] 니체의 삶 (4) | 2022.12.30 |
| [장 자크 루소] 인간 불평등 기원론 (2) | 2022.10.03 |
| [프란츠 카프카] 변신 (2) | 2022.08.20 |
| [에픽테토스] 엥케이리디온 (0) | 2022.07.28 |




